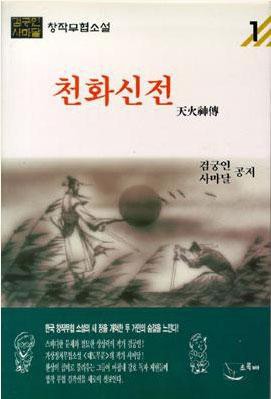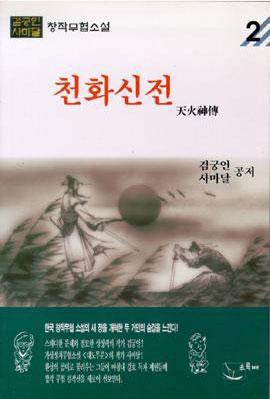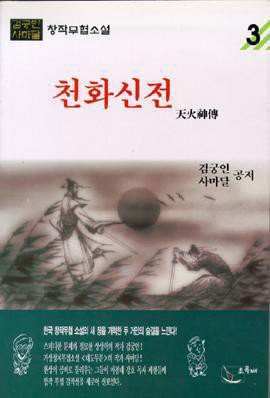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신(神)이여!
그대가 진정 존재한다면 하늘의 위대한 이름과 대지의 성스러운 뜻으로 한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여 주소서. 내 그대의 영묘로운 힘 앞에 입맞추리니, 그대의 밝은 지혜로 이 아기의 미래를 열어 주소서.
여인은 지금 산고(産苦)를 치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되기 위한 그 몸부림은 일면 처연하면서도 숭고한 것이었다.
희랑(姬娘).
이런 이름을 가진 그녀는 무한한 고통 속에서도 눈부신 아름다움을 발산해내고 있었다.
휘장이 드리워진 밀실이었다. 넓은 침상에서 그녀는 온몸이 흠뻑 땀에 젖어 있었다. 백옥 같은 얼굴도 예외는 아니었다.
희고 고른 치아는 악다물려져 있었으며 초승달같이 수려한 아미에서는 연신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다. 묻어날듯 고운 양 뺨도 역시 백짓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희랑의 입에서는 내도록 신음 한번 새어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최소한 그녀는 잊지 않고 있었다. 지금의 이 순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는지. 그러므로 그녀는 방정맞은 신음으로 이 경이롭고도 신비한 예식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감히 저지를 수가 없었다.
일명 조노파라 불리우는 주름살 투성이의 늙은 산파가 곁에 있었다. 쭈글쭈글한 손에 의해 깨끗한 수건이 희랑의 입에 물려졌다. 그것은 물론 치아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조노파의 시선은 다시 희랑의 하체에 머물렀다. 불안과 초조가 깃든 그녀의 노안이 희랑의 상태를 열심히 살피고 있었다.
'쯧! 평소 워낙 허약하셔서.......'
노파는 못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희랑의 미끈한 두 다리는 비단천으로 묶인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동산만한 배가 이따금씩 꿈틀거렸다. 그럴 때마다 좌우로 벌려진 두 다리는 흡사 물결이 파동치듯 마구 떨리곤 했다.
"하아!"
희랑의 축축한 동공이 일순 크게 확산되었다.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가슴을 들먹이며 양손으로 침상 모서리를 움켜 쥐었다.
"흐으으......."
문득 악물린 입술 사이로 격렬한 숨결이 새어나왔다. 마침내 모태 깊은 곳으로부터 이전과는 또다른 통증이 느껴진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내부를 휘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한껏 뒤로 젖혀진 고개를 따라 긴 흑발이 물결처럼 출렁거렸다. 소담스런 젖가슴의 능선에는 어울리지 않게도 굵은 핏발이 일어나 막바지에 이른 그녀의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는 조노파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다.
"마님, 힘을 내십시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대가 진정 존재한다면 하늘의 위대한 이름과 대지의 성스러운 뜻으로 한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여 주소서. 내 그대의 영묘로운 힘 앞에 입맞추리니, 그대의 밝은 지혜로 이 아기의 미래를 열어 주소서.
여인은 지금 산고(産苦)를 치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되기 위한 그 몸부림은 일면 처연하면서도 숭고한 것이었다.
희랑(姬娘).
이런 이름을 가진 그녀는 무한한 고통 속에서도 눈부신 아름다움을 발산해내고 있었다.
휘장이 드리워진 밀실이었다. 넓은 침상에서 그녀는 온몸이 흠뻑 땀에 젖어 있었다. 백옥 같은 얼굴도 예외는 아니었다.
희고 고른 치아는 악다물려져 있었으며 초승달같이 수려한 아미에서는 연신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다. 묻어날듯 고운 양 뺨도 역시 백짓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희랑의 입에서는 내도록 신음 한번 새어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최소한 그녀는 잊지 않고 있었다. 지금의 이 순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는지. 그러므로 그녀는 방정맞은 신음으로 이 경이롭고도 신비한 예식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감히 저지를 수가 없었다.
일명 조노파라 불리우는 주름살 투성이의 늙은 산파가 곁에 있었다. 쭈글쭈글한 손에 의해 깨끗한 수건이 희랑의 입에 물려졌다. 그것은 물론 치아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조노파의 시선은 다시 희랑의 하체에 머물렀다. 불안과 초조가 깃든 그녀의 노안이 희랑의 상태를 열심히 살피고 있었다.
'쯧! 평소 워낙 허약하셔서.......'
노파는 못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희랑의 미끈한 두 다리는 비단천으로 묶인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동산만한 배가 이따금씩 꿈틀거렸다. 그럴 때마다 좌우로 벌려진 두 다리는 흡사 물결이 파동치듯 마구 떨리곤 했다.
"하아!"
희랑의 축축한 동공이 일순 크게 확산되었다.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가슴을 들먹이며 양손으로 침상 모서리를 움켜 쥐었다.
"흐으으......."
문득 악물린 입술 사이로 격렬한 숨결이 새어나왔다. 마침내 모태 깊은 곳으로부터 이전과는 또다른 통증이 느껴진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내부를 휘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한껏 뒤로 젖혀진 고개를 따라 긴 흑발이 물결처럼 출렁거렸다. 소담스런 젖가슴의 능선에는 어울리지 않게도 굵은 핏발이 일어나 막바지에 이른 그녀의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는 조노파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다.
"마님, 힘을 내십시오. 거의 다 되었습니다."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대여
권당 900원3일
전권 2,700원7일
소장
권당 3,000원
전권 9,000원
무협 단행본 랭킹
더보기-
1.
신귀환생 [단행본] -
2.
절대공자 [단행본] -
3.
검신학사 [단행본] -
4.
절대강호 (개정판) [단행본] -
5.
백룡선생 [단행본] -
6.
백씨세가의 대공자는 회귀했다 [단행본] -
7.
[개정판]절대마신 [단행본] -
8.
명왕전기 [단행본] -
9.
남궁세가 망나니는 천마의 제자였다 [단행본]
개인정보보호 활동
2024-E-R047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
![천화신전 [단행본]](https://img.mrblue.com/prod_img/ebook/04133279/cover_w4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