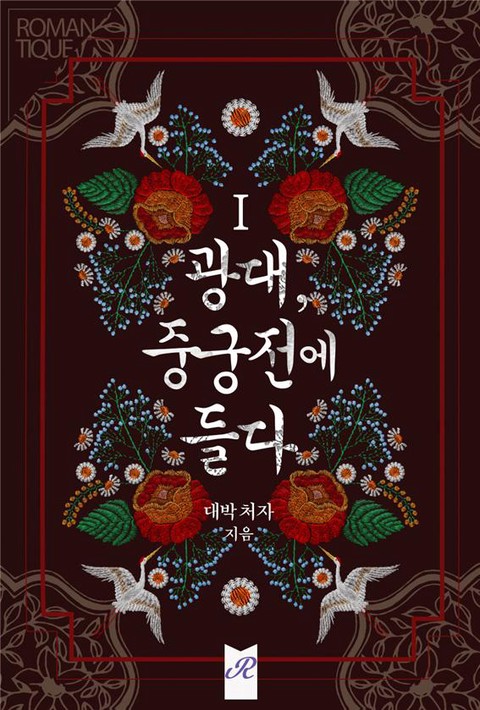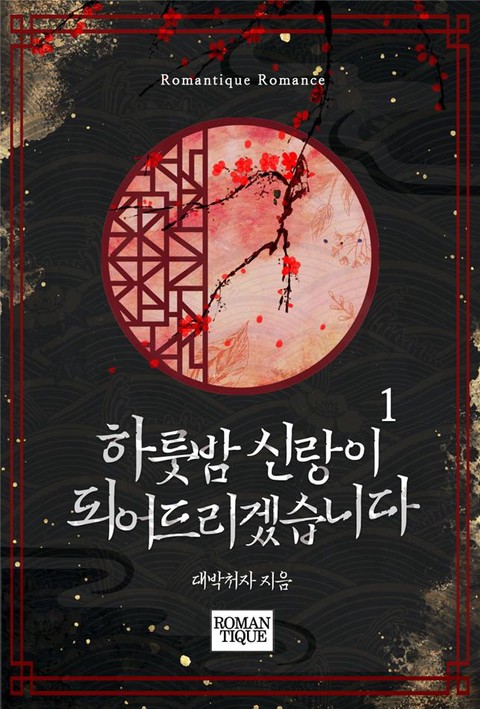- #궁정물 #동양풍 #실존역사물 #왕족/귀족 #선결혼후연애 #신분차이 #정략결혼 #다정남 #동정녀 + More
- #순진녀 #잔잔물 #5천~1만원 #2권~5권 #별점4점이상 #완결 #단행본
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연시리즈 2번째 작품
<연(緣)실을 묶다>
왕실 흠, 장애를 가진 휘온옹주.
왕실 안팎의 무심속에 19살이 되고 매번 미뤄졌던 어렵사리 가례를 치루게 되는데.......
박도준의 셋째 박시헌, 그는 원래 부마 후보자였던 둘째 형 대신 원치않게 부마가 되게 된다.
서로 원하지 않았던 가례,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본문 중에서-
시헌은 옹주와 마주 앉았다. 화려한 녹원삼을 벗은 옹주의 모습을 청초했다. 그의 눈길은 자연스레 그녀의 얼굴로 옮겨갔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얼굴이 어떠한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시헌의 예상이 또 빗나갔다. 옹주의 얼굴은 멀쩡했다. 아니 멀쩡하다는 말보다는 어여쁘다는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고개는 숙였지만, 언뜻 보이는 얼굴선은 고왔다. 하얀 피부가 어둠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시헌은 점점 혼란이 왔다. 대체 지금까지 들은 옹주의 대한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었다. 소문이 아무리 사실보다 부풀려지는 것이라지만 거짓으로 꾸며 내지 않는 이상 이처럼 사실과 다른 것도 흔치 않는 일일 것이다.
“……괜찮으십니까……?”
시헌은 어떤 말로 포문을 열까 고민하다 낮에 쓰러진 것에 대한 것이 제일 어색하지 않겠다 싶어 물었다.
“…….”
하나 옹주는 고개를 더 숙였다. 가려진 얼굴 표정이 어떠한지 모르나 뭔가 께름칙한 듯해 보였다.
“제가 불편하십니까?”
시헌은 옹주의 자신을 피하는 듯한 행동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좁혀졌다.
“아, 아니어요. 그런 것이……송구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긴장을 하여 저도 모르게…….”
처음 들어보는 옹주의 목소리는 작았다. 바로 앞인데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하는 것 같았다.
“……긴장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시헌은 당치도 않는 말이다, 송구하다는 말은 옹주마마께서 안 하셔도 된다, 말하려다 접었다. 자신은 아직 옹주에게 진정으로 그런 말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술잔에 술을 채운 시헌은 단숨에 잔을 비우고 또 한 번 술을 따랐다.
“한 잔……드시겠습니까?”
술잔을 든 그의 손이 휘온 얼굴 앞으로 쑥 들어왔다.
“…….”
휘온은 갑작스런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들었다.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두 사람. 말문을 닫은 채 상대방의 눈을 응시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 안의 촛불이 심히 일렁거린다. 휘온의 얼굴 앞에 있던 술잔이 점점 흔들리더니 맥없이 툭 떨어졌다.
‘!’
시헌은 손에서 미끄러져 상 위에 나뒹굴고 있는 술잔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괜찮으…….”
“괜, 괜찮습니다.”
시헌은 휘온의 말을 막아 버리고 재빨리 제 고개를 돌려버렸다. 순간 얼굴에 열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는가. 술을 권하다 못해 넋 빠져서 옹주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까지 했다. 고개를 숙여 있을 때도 어여뻐 보였는데 정면으로 보니 그 어여쁨이 배가 되었다. 음영에 선이 뚜렷한 코 선과 콧방울, 살짝 벌려진 붉은 빛 입술 그리고 놀란 듯 동그랗게 뜬 두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새까만 눈이 무방비하게 자신을 바라봄에 그 역시도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렸다.
“황공하옵니다…….”
시헌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렸다. 하나 휘온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휘온 또한 붉혀진 뺨을 식히려 애쓰고 있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서늘하기만 했던 방 안 공기가 열을 품기 시작했다. 하나,
“……제가 생각했던 옹주마마 모습이 아니시라 조금은……당황하였습니다.”
무심결에 한 시헌의 말에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하던 방 안이 다시 찬바람이 들었다. 어찌 보며 좋은 뜻으로 한 말일 수 있는데 처한 상황이 그리 만들지 못했다.
“……낮이 아니라서……옷에 가려져서 그리 보이는 것뿐입니다.”
시헌이 하고자 했던 말을 달리 해석한 휘온은 겉으로 드러난 제 왼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다. 시헌은 시선을 방바닥에 고정하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슬픈 표정의 얼굴에 촛불 그림자가 내려 앉아 더 슬퍼 보았다. 분을 바른 하얀 얼굴이 떨고 있었다. 보았는데…….
문득 옹주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어렴풋이 떠오른 다른 이의 얼굴……시헌은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서도 옹주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다.
그래, 맞다. 그 여인이다. 냇가를 떠나면서도 끝까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헤진 당혜의 주인……어떻게 이런 일이…….
그 여인이 옹주였다니, 옹주가 그 여인이었다니. 자신의……시헌은 그날의 그 여인의 모습을 머리에 되새김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옹주를 다시 보았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추듯 감싼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화려하고 폭이 넓은 녹원삼 속에 꼭꼭 숨겨진 그녀의 손이, 다리가 온전치 못함을 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옹주마마, 혹…….”
시헌은 그녀를 불렸으나 뒷말은 망설여졌다. 아는 체를 해야 하나? 옹주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인가? 아님……그날의 일은 들추어내기 싫은 것일까? 여러 생각이 뒤엉키자 그는 그냥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곤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시헌은 말을 돌렸다.
“……조금은…….”
휘온은 시헌이 자신에게 뭔가 할 말이 있음을 알았으나 묻지 않았다. 그가 묻지 않음이 그녀에게 어쩌면 고마운 일이였다. 그날의 일을 어찌 일일이 말하겠는가, 자신이 목숨을 끊으려 했다, 말할 수 있으랴. 자신이 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었다고, 자랑을 하랴. 그리고 당신은……어느 여인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노라 말할 수 있으랴. 그녀가 그에게 그날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저도 좀 많이 몸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리해도 될는지요?”
기다렸다는 시헌이 되물었다.
“예…….”
“마마께서는 아니 주무십니까?”
“저는 좀 있다…….”
시헌은 새 금침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
어둠보다 무서운 침묵이 방 안을 잠식해 왔다.
일각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쯤, 시헌의 가는 숨소리가 고르게 방 안을 채웠다.
“……휴우…….”
휘온은 그의 얼굴을 살피다 힘없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타들어가는 촛불을 입 바람으로 껐다.
‘사그락…….’
어둠속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났다.
<연(緣)실을 묶다>
왕실 흠, 장애를 가진 휘온옹주.
왕실 안팎의 무심속에 19살이 되고 매번 미뤄졌던 어렵사리 가례를 치루게 되는데.......
박도준의 셋째 박시헌, 그는 원래 부마 후보자였던 둘째 형 대신 원치않게 부마가 되게 된다.
서로 원하지 않았던 가례,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본문 중에서-
시헌은 옹주와 마주 앉았다. 화려한 녹원삼을 벗은 옹주의 모습을 청초했다. 그의 눈길은 자연스레 그녀의 얼굴로 옮겨갔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얼굴이 어떠한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시헌의 예상이 또 빗나갔다. 옹주의 얼굴은 멀쩡했다. 아니 멀쩡하다는 말보다는 어여쁘다는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고개는 숙였지만, 언뜻 보이는 얼굴선은 고왔다. 하얀 피부가 어둠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시헌은 점점 혼란이 왔다. 대체 지금까지 들은 옹주의 대한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었다. 소문이 아무리 사실보다 부풀려지는 것이라지만 거짓으로 꾸며 내지 않는 이상 이처럼 사실과 다른 것도 흔치 않는 일일 것이다.
“……괜찮으십니까……?”
시헌은 어떤 말로 포문을 열까 고민하다 낮에 쓰러진 것에 대한 것이 제일 어색하지 않겠다 싶어 물었다.
“…….”
하나 옹주는 고개를 더 숙였다. 가려진 얼굴 표정이 어떠한지 모르나 뭔가 께름칙한 듯해 보였다.
“제가 불편하십니까?”
시헌은 옹주의 자신을 피하는 듯한 행동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좁혀졌다.
“아, 아니어요. 그런 것이……송구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긴장을 하여 저도 모르게…….”
처음 들어보는 옹주의 목소리는 작았다. 바로 앞인데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하는 것 같았다.
“……긴장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시헌은 당치도 않는 말이다, 송구하다는 말은 옹주마마께서 안 하셔도 된다, 말하려다 접었다. 자신은 아직 옹주에게 진정으로 그런 말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술잔에 술을 채운 시헌은 단숨에 잔을 비우고 또 한 번 술을 따랐다.
“한 잔……드시겠습니까?”
술잔을 든 그의 손이 휘온 얼굴 앞으로 쑥 들어왔다.
“…….”
휘온은 갑작스런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들었다.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두 사람. 말문을 닫은 채 상대방의 눈을 응시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 안의 촛불이 심히 일렁거린다. 휘온의 얼굴 앞에 있던 술잔이 점점 흔들리더니 맥없이 툭 떨어졌다.
‘!’
시헌은 손에서 미끄러져 상 위에 나뒹굴고 있는 술잔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괜찮으…….”
“괜, 괜찮습니다.”
시헌은 휘온의 말을 막아 버리고 재빨리 제 고개를 돌려버렸다. 순간 얼굴에 열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는가. 술을 권하다 못해 넋 빠져서 옹주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까지 했다. 고개를 숙여 있을 때도 어여뻐 보였는데 정면으로 보니 그 어여쁨이 배가 되었다. 음영에 선이 뚜렷한 코 선과 콧방울, 살짝 벌려진 붉은 빛 입술 그리고 놀란 듯 동그랗게 뜬 두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새까만 눈이 무방비하게 자신을 바라봄에 그 역시도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렸다.
“황공하옵니다…….”
시헌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렸다. 하나 휘온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휘온 또한 붉혀진 뺨을 식히려 애쓰고 있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서늘하기만 했던 방 안 공기가 열을 품기 시작했다. 하나,
“……제가 생각했던 옹주마마 모습이 아니시라 조금은……당황하였습니다.”
무심결에 한 시헌의 말에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하던 방 안이 다시 찬바람이 들었다. 어찌 보며 좋은 뜻으로 한 말일 수 있는데 처한 상황이 그리 만들지 못했다.
“……낮이 아니라서……옷에 가려져서 그리 보이는 것뿐입니다.”
시헌이 하고자 했던 말을 달리 해석한 휘온은 겉으로 드러난 제 왼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다. 시헌은 시선을 방바닥에 고정하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슬픈 표정의 얼굴에 촛불 그림자가 내려 앉아 더 슬퍼 보았다. 분을 바른 하얀 얼굴이 떨고 있었다. 보았는데…….
문득 옹주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어렴풋이 떠오른 다른 이의 얼굴……시헌은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서도 옹주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다.
그래, 맞다. 그 여인이다. 냇가를 떠나면서도 끝까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헤진 당혜의 주인……어떻게 이런 일이…….
그 여인이 옹주였다니, 옹주가 그 여인이었다니. 자신의……시헌은 그날의 그 여인의 모습을 머리에 되새김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옹주를 다시 보았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추듯 감싼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화려하고 폭이 넓은 녹원삼 속에 꼭꼭 숨겨진 그녀의 손이, 다리가 온전치 못함을 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옹주마마, 혹…….”
시헌은 그녀를 불렸으나 뒷말은 망설여졌다. 아는 체를 해야 하나? 옹주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인가? 아님……그날의 일은 들추어내기 싫은 것일까? 여러 생각이 뒤엉키자 그는 그냥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곤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시헌은 말을 돌렸다.
“……조금은…….”
휘온은 시헌이 자신에게 뭔가 할 말이 있음을 알았으나 묻지 않았다. 그가 묻지 않음이 그녀에게 어쩌면 고마운 일이였다. 그날의 일을 어찌 일일이 말하겠는가, 자신이 목숨을 끊으려 했다, 말할 수 있으랴. 자신이 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었다고, 자랑을 하랴. 그리고 당신은……어느 여인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노라 말할 수 있으랴. 그녀가 그에게 그날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저도 좀 많이 몸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리해도 될는지요?”
기다렸다는 시헌이 되물었다.
“예…….”
“마마께서는 아니 주무십니까?”
“저는 좀 있다…….”
시헌은 새 금침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
어둠보다 무서운 침묵이 방 안을 잠식해 왔다.
일각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쯤, 시헌의 가는 숨소리가 고르게 방 안을 채웠다.
“……휴우…….”
휘온은 그의 얼굴을 살피다 힘없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타들어가는 촛불을 입 바람으로 껐다.
‘사그락…….’
어둠속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났다.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소장
권당 3,500원
전권 7,000원
시리즈
개인정보보호 활동
2023-E-R048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