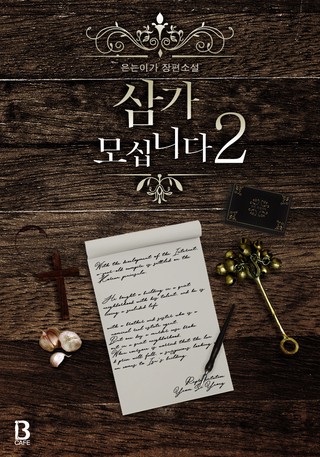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한반도에 자리잡은 사연 많은 흡혈귀 이수.
가진 재주로 조용한 동네에 건물 하나 사서,
명목상 부동산중개인인 형제 이청과 티격태격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조용한 동네에 살인사건이 터지고,
수상해보이는 한 남자가 아르바이트생 김영 함께 이수의 건물에 찾아오는데.
<삼가 모십니다 흥신소 대표 염시영>
첫만남부터 피곤하고, 흡혈귀만큼 잘생긴 이 남자.
그냥 흥신소 사장은 아닌 것 같다?
“계십니까.”
도로 소파에 가 모로 누울 생각을 하는데 불청객이 안부를 물었다. 손님이었다. 분명히 따로 올 손님이 없으니 잠시 봐 달라고 했는데, 역시 청의 말은 믿을 게 못 되었다. 수는 간이 테이블 위에 올려 둔 모자를 챙겨 쓰고 한쪽 귀에 걸치고 있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며 한 번 더 손으로 눈을 비볐다. 혹시 몰라서 착용한 컬러렌즈가 눈알에서 뻑뻑하게 따로 놀고 있었다. 겉옷 주머니에 넣어 둔 식염수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사무실 문을 살포시 열어 머리만 빼꼼 내밀었다.
“죄송해요. 나중에 오세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높낮이 없이 딱딱한 말투로 국어책 읽듯 말하자 남자가 웃음을 터트렸다.
“여기 직원이세요?”
수는 빨리 문을 닫고 싶었고, 웃으며 버티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자가 웃자 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제 말이 우스운 건지. 짜증이 일었다. 그러니까 남자의 별 뜻 없는 물음은 수같이 배배 꼬인 흡혈귀가 들으면 여기 서비스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사장 나와! 하는 말이었다. 400년이 넘게 성격을 한 땀 한 땀 꼬아온 수는 그렇게 알아들었다. 인상을 팍 쓰며 아래를 보고 있던 시선을 위로 올렸다.
“나중에 오라는데… 뭐 이렇게 흡혈귀처럼….”
생겼어? 순간 놀라 마지막 말을 삼키며 제 입을 손으로 때렸다.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이었다. 수는 할 수만 있다면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다.
남자는 웃는 얼굴로 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좀 오바해 말하자면 이 나라에서 백 년에 한 번 볼 만한 준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칫 잘못 보면 흡혈귀라고 오해할 만큼 한 생김새 했다. 수는 눈을 끔벅였다. 흡혈귀일까, 위아래로 남자를 스캔했다. 초면에 무례한 행동이란 자각을 하면서도 시선을 멈출 수 없었다.
“제가 좀 흔한 얼굴이죠?”
가진 재주로 조용한 동네에 건물 하나 사서,
명목상 부동산중개인인 형제 이청과 티격태격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조용한 동네에 살인사건이 터지고,
수상해보이는 한 남자가 아르바이트생 김영 함께 이수의 건물에 찾아오는데.
<삼가 모십니다 흥신소 대표 염시영>
첫만남부터 피곤하고, 흡혈귀만큼 잘생긴 이 남자.
그냥 흥신소 사장은 아닌 것 같다?
“계십니까.”
도로 소파에 가 모로 누울 생각을 하는데 불청객이 안부를 물었다. 손님이었다. 분명히 따로 올 손님이 없으니 잠시 봐 달라고 했는데, 역시 청의 말은 믿을 게 못 되었다. 수는 간이 테이블 위에 올려 둔 모자를 챙겨 쓰고 한쪽 귀에 걸치고 있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며 한 번 더 손으로 눈을 비볐다. 혹시 몰라서 착용한 컬러렌즈가 눈알에서 뻑뻑하게 따로 놀고 있었다. 겉옷 주머니에 넣어 둔 식염수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사무실 문을 살포시 열어 머리만 빼꼼 내밀었다.
“죄송해요. 나중에 오세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높낮이 없이 딱딱한 말투로 국어책 읽듯 말하자 남자가 웃음을 터트렸다.
“여기 직원이세요?”
수는 빨리 문을 닫고 싶었고, 웃으며 버티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자가 웃자 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제 말이 우스운 건지. 짜증이 일었다. 그러니까 남자의 별 뜻 없는 물음은 수같이 배배 꼬인 흡혈귀가 들으면 여기 서비스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사장 나와! 하는 말이었다. 400년이 넘게 성격을 한 땀 한 땀 꼬아온 수는 그렇게 알아들었다. 인상을 팍 쓰며 아래를 보고 있던 시선을 위로 올렸다.
“나중에 오라는데… 뭐 이렇게 흡혈귀처럼….”
생겼어? 순간 놀라 마지막 말을 삼키며 제 입을 손으로 때렸다.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이었다. 수는 할 수만 있다면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다.
남자는 웃는 얼굴로 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좀 오바해 말하자면 이 나라에서 백 년에 한 번 볼 만한 준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칫 잘못 보면 흡혈귀라고 오해할 만큼 한 생김새 했다. 수는 눈을 끔벅였다. 흡혈귀일까, 위아래로 남자를 스캔했다. 초면에 무례한 행동이란 자각을 하면서도 시선을 멈출 수 없었다.
“제가 좀 흔한 얼굴이죠?”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소장
권당 3,800원
전권 7,600원
BL 단행본 랭킹
더보기-
1.
개와 새 [단행본] -
2.
금단 위에 순정 [단행본] -
3.
짝사랑의 불문율 [단행본] -
4.
7분의 천국 [단행본] -
5.
가이드를 함부로 줍지 마세요 [단행본] -
6.
이 거리감, 거북합니다 [단행본] -
7.
열대어의 집 [단행본] -
8.
돼지 정괸이 [단행본] -
9.
동정 연애 [단행본]
개인정보보호 활동
2024-E-R047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
![[BL] 삼가모십니다 [단행본]](https://img.mrblue.com/prod_img/ebook/arete0056/cover_w4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