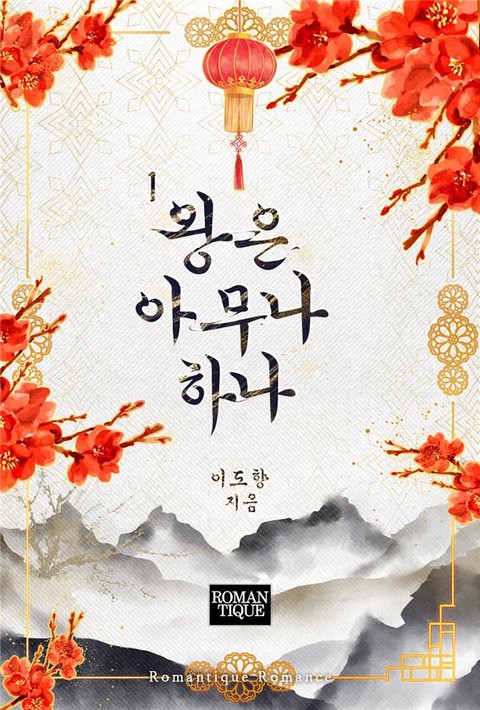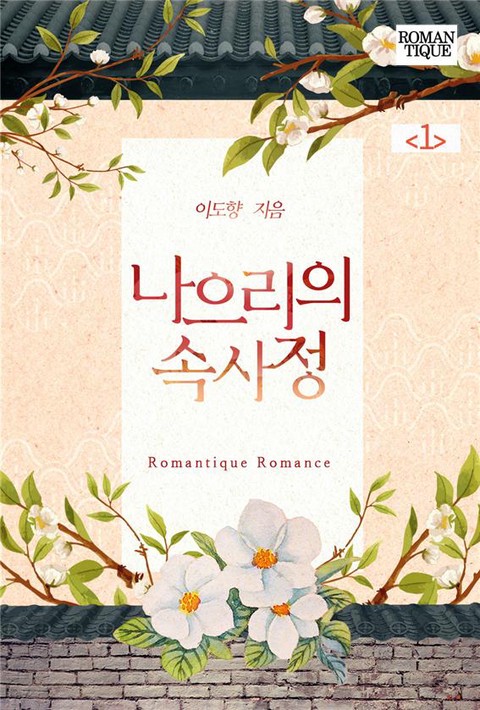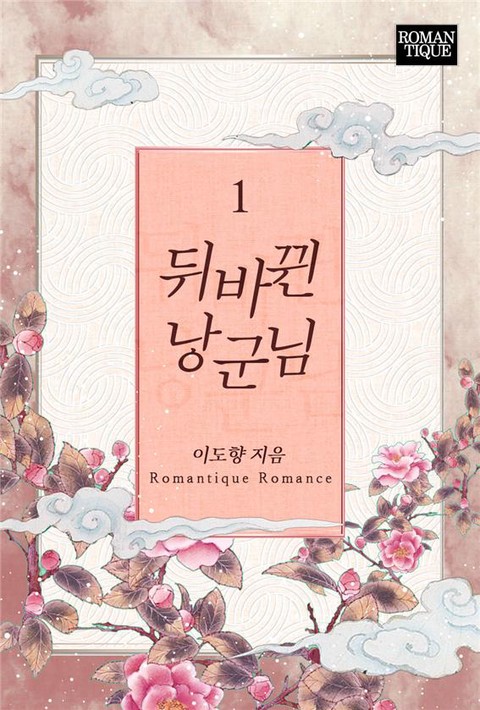-
1권
2021.01.27 약 10만자 3,000원
-
2권
2021.01.27 약 10.4만자 3,000원
-
3권
2021.01.27 약 11.1만자 3,000원
-
4권
2021.01.27 약 11.3만자 3,000원
-
5권
2021.01.27 약 10.8만자 3,000원
-
6권
2021.01.27 약 11.1만자 3,000원
-
완결 외전
2021.07.20 약 6.3만자 2,000원
이용 및 환불안내
이용방식별 이용기간 안내
- 정액제정액제로 제공되는 작품에 한하여 정액권을 보유중인 기간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대여구매 시점부터 3일(72시간)간 이용 가능
- - 선택 구매 또는 전체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 - 일부 작품의 경우 1일 또는 2일간 이용 가능
- - 2개 회차 이상 일괄 대여 또는 전체 대여 시, 모든 회차의 이용기간은 동일
- 소장구매 시점부터 이용기간 제한 없이 해당 계정으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
이용안내
- 구매한 작품은 Web(PC, 모바일)과 APP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급 된 무료쿠폰은 구매 취소 및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안내
- 구매 후 7일 이내에,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구매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1개 회차도 뷰어를 오픈하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놈의 서책만 볼까.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항상 연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 상의도 없이 연을 강원도 산골짜기 자신의 친구 집으로 보내 버렸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연으로 인해서 강원도 산골 소녀 남윤은 살기 위해 원치 않은 남장을 하게 되었다.
속사정 따위 모르는 연에게 여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고군분투하는 동안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러면 뭐 하겠는가.
사내인 겉모습 때문에 다가설 수 없는데 이런 현실이 남윤은 서글펐다.
서로 다른 비밀을 품은 두 남녀의 아찔한 동거는 연을 찾아 강원도까지 온 빈궁으로 인해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갈등은 깊어지고 오해는 쌓여만 가는 반면에 함께할 시간은 점점 줄어간다.
그러다 찾아온 비극 앞에 남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궐 구경하다가 죽을 뻔
#살려고 팔자에 없는 사내 행세
#정체를 들킬까 싶어 걱정되는 아찔한 동거
#우정보다 깊은 사랑
#아픔도 잊게 하는 건 그대
[미리보기]
“저 방이 좁아서 이 방으로 온 것이 아니었느냐?”
“저 방이 좁은 것은 맞지만 이 방에서 자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자려고?”
“일단 이 손은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내 녀석에게는 취미 없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잡고 있기로서니 닳는 것도 아닌데. 유난이구나.”
“불편해서 그럽니다.”
연이 손을 잡은 이후로 남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피가 빠르게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열이 올랐다. 거기에 손바닥에 땀까지 찼다. 이러한 몸의 변화를 연이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남윤은 바라였다.
그가 보기에 남윤은 사내였다. 사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똑똑히 말했다. 그래놓고 사내에게 반응하면 그가 분명히 이상하게 볼 터였다.
연에게 잡힌 손을 빼기 위해서 남윤이 손을 비틀었다. 그럴수록 연은 힘을 더욱 세게 주어 손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손이 아플 정도가 되어서야 남윤은 포기하였다.
“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사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셨습니까?”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남윤이 버럭 성을 내었다.
“그 성질 한번 고약하구나.”
“고약한 줄 아시면서 왜 자꾸 건드리십니까?”
“내가 염치도 없는 줄 아느냐?”
연이 힘을 주어 잡고 있던 남윤의 손을 제 쪽으로 잡아당겼다. 균형을 잃은 남윤의 몸이 연이 있는 방향을 향해 기울기 시작하였다.
“어, 어?”
무언가 손써 볼 도리가 없었다. 남윤이 연의 품에 폭 안겼다.
“게다가 넌 내가 눈치도 없는 줄 알지. 아니 그렇냐?”
어린아이처럼 제품에 쏙 안긴 남윤의 눈을 보며 연이 말하였다. 교교한 달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연의 나른한 숨결이 남윤의 얼굴을 간질였다. 주변이 밝았다면 속눈썹의 개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가까웠다.
파도에 출렁이는 돛단배처럼 남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들켰나?’
리뷰 운영방침 안내
모니터링에 의해 아래 내용이 포함된 리뷰가 확인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리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욕설 및 비방 글을 등록한 경우
- 2.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 3. 홍보 및 상업성 글을 등록한 경우
- 4. 음란성 글을 등록한 경우
- 5.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 6. 본인 및 타인의 개인 정보(실명, 연락처, 메일 주소 등)를 유출한 경우
- 7. 반사회성 글을 등록한 경우
- 8. 기타 관리자 판단에 의해 제공 서비스와 관계없는 글을 등록한 경우
정가
권당 2,000 ~ 3,000원
전권 20,000원
로맨스 단행본 랭킹
더보기개인정보보호 활동
- 미스터블루(주)
- 조 승 진
- 미스터블루
- https://www.mrblue.com
- 개인정보보호마크 : http://www.e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마크 인증사이트 현황
![세자와의 아찔한 동거 [단행본]](https://img.mrblue.com/prod_img/ebook/E000074176/cover_w480.jpg)